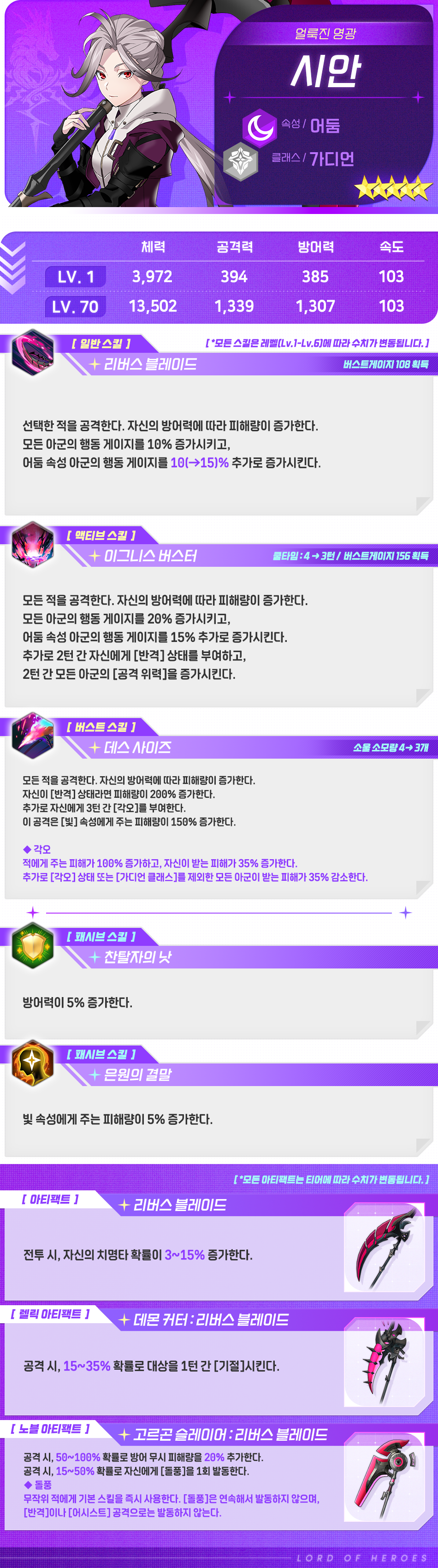다케온, 그 그리운 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왕권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금 계승이 이루어진 신비한 나라 말입니다. 발톱을 감춘 사자의 손속은 매서웠고 그걸 적법한 계승이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불만은 금세 사그라들었죠. 용병들이 간절히 바라온 것은 기댈 토대였고, 시안은 그걸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에서 화평만으로 이은 선은 삐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쟁취하겠다.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시안이 내린 결정들은 주변국을 당황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었지만 이 뜻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화합도 화평도 아닌 쟁취. 시안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용병들을 단련시켰죠. 숫자를 읽는 법, 받는 만큼 일하는 법, 서글서글한 말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법. 비록 엄포와 강요에 가까운 선언에 하나 둘 성문을 나서는 이들도 많았지만, 시안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슬 푸른 날이 왜 실각된 왕에게로 향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는 여럿 추측이 있었죠. 다만 중요한 건 현재 브루코스의 이름을 이은 아슬란이 새끼 사자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간에는 제자리를 되찾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뭐,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죠. 하늘이 갈라진 날, 닥쳐온 선택의 순간에서도 시안은 망설이지 않았으니까요.
방식이 어떠했든, 시안이 걸었던 모든 길에는 언제나 용병들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테고, 시안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무기 삼아 나아가겠지요. 그 도중에 무엇을 만날지, 그것들이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