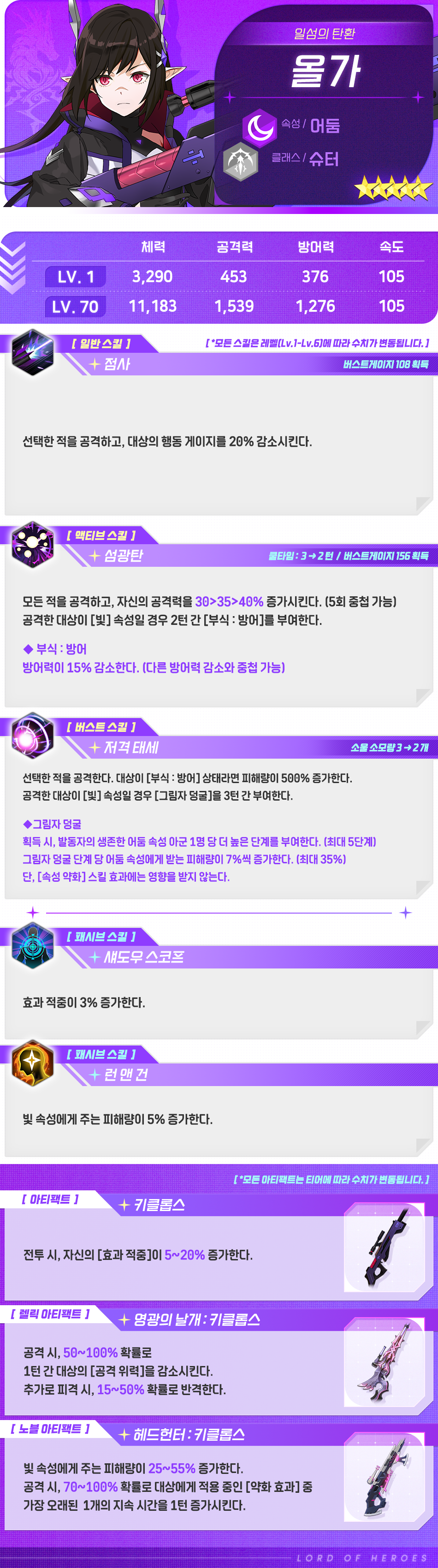레지스탕스 은신처는 오래전부터 폐허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쥐를 잡거나 들개를 쫓던 아이들 사이에서, 오직 한 아이만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올가의 표적은 시체를 찾아 배회하는 까마귀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쏠 수 있다면 제국의 태양을 겨누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폐허에는 세상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약자를 착취하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희망을 좀먹는 어른들의 위선과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아이들의 처절함은 '저항'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아이러니였죠. 올가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바꾸고자 하는 의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자세가 잡힐수록 각오는 굳건해졌죠.
왕녀와의 만남은 올가의 편견을 깨트려주었습니다. 제국에 부역하던 왕족 중에 올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제국을 증오하는 이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뜻이 같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은 모두가 반대하던 제국 연구원과의 협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배된 왕녀를 위해 방해공작을 펼치는 동안에도 제국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습에 은신처가 무너지던 순간 풍겨오던 절망의 냄새. 그대로 절멸인 줄 알았건만, 쓰러진 저항군들은 얼마 후 멀쩡히 깨어났습니다. 공습 무기의 의도된 결함, 그건 곧 어떠한 가능성을 의미했죠. 지나치게 운이 좋았던 몇 번의 사건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렸습니다.
주변의 만류를 뒤로하고, 올가는 극적인 타이밍에 등장해 협력자를 찾아냈습니다. 심부를 해체할 열쇠를 손에 넣었으니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차례였죠. 그렇게 단 한 발의 총성이 황제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태양은 산산조각 났고, 파괴하고 파괴당하던 시대도 노을처럼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이 지나가도 시계는 돌아가는 법입니다. 칠흑의 밤 속에서도 태양의 잔상은 남아 있습니다. 영광에 머물 여유는 없으니 우선은 폐허부터 복구해야겠죠.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빛을 기다리다 보면... 혹시 모르죠. 또 한 번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지도.